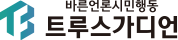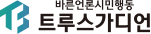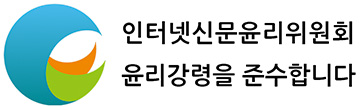현행 간첩 법규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문제와 국회 형법개정안을 검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선 국회 개정안이 간첩의 범위를 넓힌 점은 평가할 만하나, ‘국가기밀’의 범위에 ‘국가안보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하루속히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과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안보단체는 22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재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개정안의 핵심은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통적 개념의 간첩 외에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첩 행위’의 개념도 ‘적국의 지령, 사주’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넓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간첩죄 관련 남은 과제는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라며 “적국에 포섭돼 지령 수수 후 탐지·수집·누설의 경우에는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비공지성 및 실질비성’의 허들이 낮아지길 기대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간 간첩 재판에서 법원이 ‘비밀’의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국회 개정안에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대목을 ‘국가기밀 및 국가안보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으로 넓혔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공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공사범은 먼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 이념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범죄 전문가다. 또 이들은 장기간 암약하며 흔들림이 없다. 범행지가 제3국이 많아 범증 수집이 어렵고 형사공조도 어렵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찰과 국정원이 협업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결국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 과학수사 능력, 휴민트(인적 정보망) 차원에서 봤을 때 국정원을 따라올 대공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흔히 대공수사는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며 “여러 업무분야가 응축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의미다. 모든 부서가 국가안보 업무로 연결돼 있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맡아야 하는 이유”라고 단언했다.
‘국가정보·수사 기능 정상화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정보·수사권 원상회복을 통해 국가안보체제를 튼튼히 하고 바람직한 대북·안보·통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