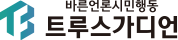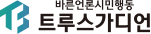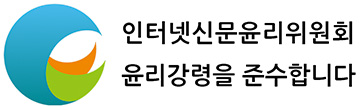가짜뉴스가 쉽게 퍼지고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 소비자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첫째 이른바 ‘확증편향’의 문제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더 잘 반응한다.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내용을 접하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쉽게 믿는다. SNS의 알고리즘도 이런 편향을 강화한다.
또 반복해서 들은 내용, 익숙한 정보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인지적 편안함’의 문제가 있다. 많이 노출된 정보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낯익은 것이 거짓이라도 인지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많이 들어본 정보를 더 믿게 되고, 객관적 검증보다는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판단한다. 이를 ‘가용성 편향’이라고 한다.
같은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프레이밍)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데, 표현 방식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믿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럴싸한 내용이 더 진짜같이 여겨진다.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
자신의 집단을 지키거나 타 집단을 배척하려는 동기 때문에 거짓임을 알면서도 '믿고 싶은' 정보를 믿는 경우도 많다. 현재 유튜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회를 갔다는 거짓 쇼츠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믿고 싶은’ 동영상이기에 계속 소비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보 과부하와 피로감 즉,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일일이 검증하는 게 어려워져 단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간다. 또 자기만 모르는 것이 분할까봐, 혹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주목받고 싶어서 그럴싸한 거짓 주장을 퍼뜨리기도 하며, 지적 겸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듣기 싫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을 선호하며, 불확실한 상황이나 불안한 시기에는 가짜뉴스가 더욱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