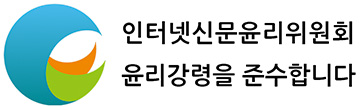22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향년 79세)은 ‘재야 운동권 대부’ ‘영원한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를 가진 민주화 운동가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장 원장의 별세를 계기로 생전 그의 삶에 대한 찬사를 사설에 실었다. 한마디로 ‘반특권 정신의 표본’이란 것으로 평가가 모아진다.
장 원장은 민중당을 창당하고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러면서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중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관리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 같은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도 성공한 김 장관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유는 그 자리가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장 원장은 민주화 보상금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만일 돈을 받았으면 10억대에 달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장기표 씨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장에는 5만7000원밖에 없었지만, 어렵게 돈을 마련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썼다. 10억원 대 보상금을 거절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화 특권층은 후보 매수 전과에 선거보전금 30억원을 미납하고도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고 쏘아붙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를 소환한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장씨는 ‘한국의 특권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출세한다’고 했다”며 “마지막까지 특권층과 싸웠던 장씨의 마지막 경고”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장 원장이 남긴 교훈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장 원장이 “나만 민주화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 (민주화운동) 당시 최루탄 가스 안 마셔 본 국민이 얼마 있겠나. 넥타이 부대도 많이 민주화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사실을 들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 한 걸 무슨 훈장처럼 재탕·삼탕 우려먹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에게까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버젓이 발의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다 들켜도 ‘정치보복’이라 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한다며 국민에게 돈을 거둬 횡령이나 하던 이들이 ‘진보’ ‘민주화 세력’이라며 완장을 찬 기이한 정치판”이라고 꼬집으며 “(장 원장의) 마지막 당부의 말도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였다. 장기표가 남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상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