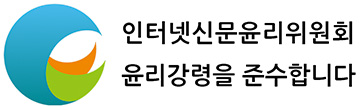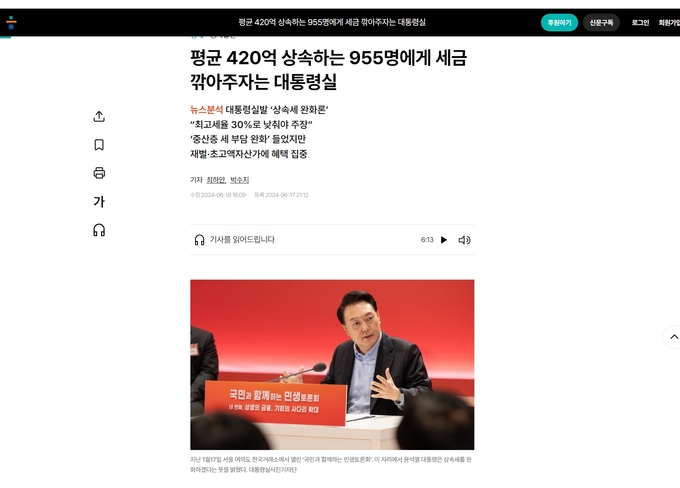
한겨레는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속세 감세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소수의 사람들이 특혜를 본다고 하는 것은 특혜를 본다고 비판받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당연히 감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서 대표는 최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 상속세를 폐하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아래는 상속세 감세에 대한 한겨레의 비판과 이에 맞서는 서 대표의 반박이다.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 Vs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데 어떻게?"
한겨레는 “현재 피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자는 매우 적다. 2022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은 34만8159명이었고, 이 가운데 4.5%(1만5760명)만 상속세를 냈다”며 “상속재산에 배우자 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현행 체계에선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그리고 ‘기초공제(2억원)+자녀 등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등 다양한 인적공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2018년 대비 2022년 상속세 납부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표 구간은 두 번째로 낮은 명목세율(20%)이 적용되는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다. 2022년 이 구간 납부자는 총 6336명으로 2018년 대비 3075명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2022년 기준 10억4900만원, 1인당 결정세액은 3700만원이었다.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3.5%에 그쳤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과표(세율 30%)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70명)의 경우, 1인당 상속세 과세가액은 평균 15억6400만원, 결정세액은 1억3100만원이었다. 이들의 실효세율 8.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마지막으로 개편된 1997년 당시 상당 기간 그대로 가도 될 정도로 획기적으로 공제액을 늘려놓은 것이다. 여기서 공제액을 더 늘려 1~2%만 내는 세금으로 만든다면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한다는 상속세 기능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대표는 “한겨레는 학자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상속세가 마치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속세는 일반 예산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의 2%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최고세율 인하? "재벌 봐주기" Vs "상속세 감세가 오히려 서민경제 살리기"
한겨레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언급한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는 중산층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이야기다”며 “2022년 법정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955명(전체 피상속인 중 0.27%),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420억원에 이른다. 한 해 1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인 셈이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히 과표 30억원 넘는 초고액 자산가 가운데서도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은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아주 극소수(2022년 기준 20명)에 집중될 전망이다”며 “과표 500억원 초과 피상속자(1인당 상속세 과세가액 평균 1조6천억원)들이 납부한 상속세 전체 금액은 14조7958억원으로, 같은 해 전체 상속세수(19조2603억원)의 76.8%를 차지했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이 기사에서 “과표와 공제 체계 등이 오랜 기간 그대로인 만큼 일부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여당은) 재벌들의 소원 수리와 뒤섞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대표는 “한겨레가 최고세율 인하를 평균 420억을 상속하는 초고액 자산가 1천 명만 혜택 본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10억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각각 3.5%, 8.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평균 420억을 상속하는 거액 상속자가 955명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소수의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속세 감세가 부자 감세가 아닌 이유는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클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로지 상속증여세에 의해 묶여 있는 민간의 자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감세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다른 하나는 서민들에게 있어 단 몇백~몇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 상속세 일지라도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며 “사람이 유일한 자산인 한국에서 사람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여 부흥을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은 낮은 세금이지 높은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