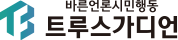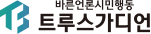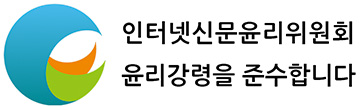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핵공유’ 논란을 둘러싸고 미 고위당국자가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확인해준 데 대해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그 용어에 지금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미국 보스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는 아니다.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고 그런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용어에 대해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다만 나토는 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30여개국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에 NCG(신설되는 핵협의그룹)를 통해서 이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더 실효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실제 배치하고 있는 나토와 달리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자산 운용 등과 관련해 양국이 정례적 협의를 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한반도에 수시 배치하는 등 핵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핵공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워싱턴 선언은 그런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자 간에 어떻게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꼭 다른 어떤 기구와의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언급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SSBN의 정례화된 전개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실질적 조치들을 통해 안보 불안을 불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배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대통령실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6일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미정상회담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놓고 양국이 벌써 입장 차를 확인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비판했다.
미국은 ‘핵공유’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신중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을 미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해 한층 강화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지만, 핵사용 ‘단일 권한’을 한국과 공유할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아가 ‘핵공유’ 표현이 자칫 한국 내 핵무기 반입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가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