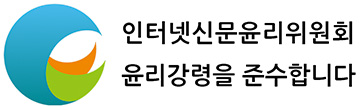우리나라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2032년까지 저출생 정책을 집약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33년부터는 가임 여성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 센터장은 “가임 여성 인수 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합계 출산율 하락이 가세해 출생아 수가 더욱 떨어졌다.
또 2015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지속됐다. 특히 서울·부산 등 특·광역시에서 낮고, 반면 전남·강원·경북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부산 등지는 미혼 인구 및 무자녀 비중이 높아, 평균 출생아 수가 적다. 경기는 미혼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무자녀 비중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적은 편이다.
또한 전국 가임 여성 중 40%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경기 포함해 50%가 이곳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게 문제다.

이 센터장은 “2023~2032년 10년 동안 가임 여성 인구 수 150만명 정도가 유지된다”며 “이때 저출산 정책을 빨리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33년부터 가임 여성이 급감하기 때문인데, 이때부터는 출생률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해 충분한 유인과 상대적 혜택(benefits)이 주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을 맡은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등 출산지원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면에서 육아휴직 이용률(특히 남성)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여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 복귀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출산지원) 급여 예산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기 떄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기자